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 맞닥뜨리는 세금의 벽은 단순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경비 처리’, 즉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런데 많은 프리랜서들이 “나는 장부 작성도 안 하고, 세무대리인도 없는데 어떻게 비용을 처리해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인데,
국세청이 ‘장부 없이 신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비율로 비용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만 신고하면, 비용은 정부가 정한 비율로 계산해 주는 방식.
하지만... 이 제도, 그냥 쓰면 큰코다칠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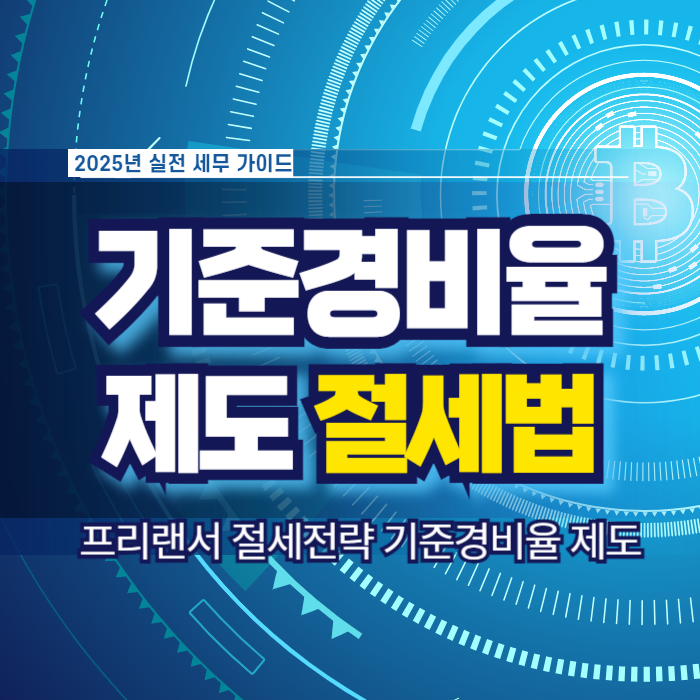
기준경비율 제도
기준경비율 제도란, 말 그대로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프리랜서나 간편 장부 대상자가 “내가 5,000만 원 벌었어요”라고 하면 국세청은 업종별로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60%라면, 수입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는 거죠.
✔ 실제로 쓴 경비랑 상관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절세에는 불리한 방식
이 제도는 초보 프리랜서에겐 간편하고, 부담 없고, 귀찮지 않아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절세에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경비가 많이 들어간 프리랜서일수록 기준경비율보다 직접 장부를 써서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디자인 프리랜서가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료, 외주비 등으로 3,500만 원을 실제로 지출했는데 기준경비율은 60%라면, 정부는 3,000만 원만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냥 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경비가 많이 드는 업종(영상, 콘텐츠 제작, 촬영, 교육 등)은 기준경비율만 믿고 신고하면 무조건 손해일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 제도 적용 대상
- 간편 장부 대상자 중 장부 미작성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람
- 1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2025년 기준으로는
-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 서비스/기타: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장부만 제대로 쓰면 기준경비율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업종별 기준경비율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2024년 예시 기준으로 보면,
| 업종 | 기준경비율 |
| 번역, 통역업 | 60% |
| 사진 및 영상제작업 | 58% |
| 교육 서비스업 | 57% |
| 온라인 마케팅업 | 62% |
| 작가·예술가 등 | 55% |
→ 즉,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최소 40~45% 이상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실제 경비가 많았다면 이보다 훨씬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장부 작성 시 장점
- 실제 지출한 경비 전부 인정 가능
-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이 비용을 공제받아 세금 줄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대출, 세무조사, 소득증명 등에서도 유리
- 5년 치 세금 내역 통제 가능
장부 쓰는 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간편 장부 어플/프로그램도 많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저렴하게 위탁도 가능하기에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
기준경비율 제도는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안전장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수입이 늘고, 경비 지출도 많아지면 장부를 작성하는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세금은 모르고 내면 ‘벌금’은 아니지만 ‘손해’입니다. 어떻게든 경비처리를 많이 해서 과세소득을 줄이는 게 절세의 핵심이죠.
“경비율 믿고 200만 원 세금 더 냈어요” 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죠.
장기적으로 절세는 ‘수고’에서 나온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장부 쓰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